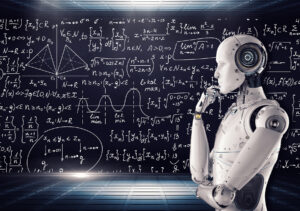파라과이 40년, 자비량 선교사의 고백
사람들은 그를 두고 “대단한 선교사”라고 말한다. 파라과이에서 40여 년, 90% 이상을 자비량으로 선교해 온 삶. 교회 개척과 병원 운영, 인디안 마을 자립 프로젝트, 혼혈아 교육 사역까지 인간의 계산으로는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사역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고개를 젓는다.
“대단한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종업원일 뿐입니다.”

그의 선교 여정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전세방을 빼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1,000평 밭을 팔아 파라과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아파트 한 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당시 그의 손에는 뜨거운 열정 하나밖에 없었다. 서류 수속과 항공권을 마련하고 나니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아내의 퇴직금 1만 달러로 옷장사를 시작했지만 경험도 자본도 부족했다. 3년 만에 실패했고, 빚을 내 편의점을 다시 열었다. 차비조차 없어 물건을 사러 갈 때는 걸어가고, 돌아올 때만 버스를 탔다.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와 장사한 뒤 다음 외상값을 갚는 날들의 반복이었다. 하루 16시간 넘게 일하며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자비량 선교는 점차 열매를 맺었다. 뜻을 함께한 성도들과 감리교회를 개척했고, 현지인 교회를 건축해 21년간 사역했다. 선교병원은 13년간 운영되었고, 한인 혼혈아 50여 명을 23년째 돌보며 교육과 자립을 도왔다. 현지 인디안 청년 3명을 신학교에 보내 목회자로 세웠고,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웠다.
특히 그의 사역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예수마을로 불리는 인디안 마을 자립 프로젝트다. 2004년 4월, 전기와 물도 없는 오지 인디안 마을에서 나무 그늘 아래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었다. 폭죽을 터뜨려 “선교사가 왔다”는 사실을 알렸고, 아내가 벌어 보내준 선교비로 3년 6개월 만에 교회를 봉헌했다.
2012년, 그는 이 마을을 새마을 운동을 통한 예수마을로 선포했다. 진입로를 개통하고, 전기를 가설했으며 지하수를 개발해 가정마다 수도를 설치했다. 돼지를 나눠주어 가정 소득을 만들고, 판잣집을 벽돌집으로 바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이뤄졌다. 총 50만 달러 규모의 주택 건축 선교를 진행하며 KOICA 꿈의 집 짓기 촬영을 지휘하기도 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양계 사업까지 확장해 마을은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말한다.
“인디안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산속으로 밀려나 살던 분들입니다. 이 마을이 대통령이 와서 보여줄 수 있는 모범 마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선교는 교회 울타리를 넘는다. 감리교 선교국 파송 선교사이자 경기남부경찰청 경목회원, 세계태권도선교연맹 파라과이 선교사로서 파라과이 경찰학교와 협력해 매주 200명이 예배드리는 경목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태권도와 한글학과 개설, 한인 밀집 지역 내 한국인 경찰서 설립을 꿈꾸며, 한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는다.
이 모든 사역의 뒤에는 아내가 있다. “돈이나와, 밥이나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아내는 지금도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선교비를 돕고 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외식 한 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아내 앞에서 그는 늘 빚진 마음이다.
이제 그는 선교국으로부터 은퇴 권고를 받는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쉬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52년생이 아니라 52살”이라 부르며 마지막 사역지로, 한인 거주지에서 4시간 떨어진 오지에 홀로 들어갔다.
“이제는 선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끝까지 낮춘다.
“선교는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40년의 시간, 수많은 사역,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순종의 발걸음. 그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나고 보니,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