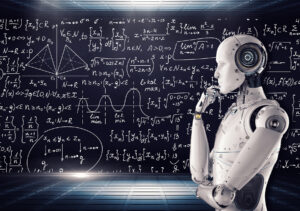경찰서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멈칫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건과 범죄가 떠올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묵묵히 하루를 버티고 있는 누군가의 삶이 떠올라서이다.
홍항표 목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들여다보아 온 목회자다. 그는 경찰을 ‘국가의 칼’로 보지 않는다. 먼저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그 뒤에 한 가정을 본다. 그래서 그의 길은 자연스레 경찰선교라는 좁고도 험한 길로 이어졌다. 처음부터 거창한 비전을 품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힘겨운 치안 업무 속에서 방황하는 경찰 한 명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국경목총회에서 총무를 맡았고, 총회장을 맡았고, 다시 논설고문으로 조용히 뒤를 받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직책의 높낮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대신 누구보다 현장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지구대와 파출소, 기동대, 경찰대학, 그리고 교정시설까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는 늘 같은 마음이었다.

‘이들에게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느끼는 두려움, 매일 사건 현장에서 마주하는 피로와 공허, 가정에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 같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짐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다. 그들의 영혼에도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이야기한 것도 그였다.
그래서 그의 선교는 자연스럽게 경찰 가족에게로, 더 나아가 교정시설의 재소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그는 재소자들을 보며 “이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또 다른 아픔”이라고 말하곤 했다. 복음은 위험과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갈 때 더 빛난다는 그의 신념은 그렇게 경찰선교와 교정선교라는 두 갈래의 길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다.
홍 목사를 오래 지켜본 이들은 그를 화려한 언어로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는 사람, 누군가의 눈물을 오래 듣는 사람, 세상의 소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괴어 안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한다. 선교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며, 마음이 없는 일은 아무리 공들여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오래된 믿음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크게 떠들지 않는다. 조용히, 하지만 한결같이 현장으로 향한다. 경찰들의 어두운 마음 한쪽에 촛불 하나 켜 주는 일을 그는 지금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긴다.
누군가 그에게 왜 이렇게 긴 세월을 경찰 곁에서 보내고 있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잠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다.
“빛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요.”
그의 대답은 거창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마음에 남는다. 경찰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온 사람. 홍항표 목사의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길 위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숨결과 이야기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다.